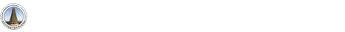자랑스러운 우리 한글(한국미술비평연구소 대표)
장준석 | 조회 971
자랑스러운 우리 한글
장 준 석
한국미술비평연구소 대표
용인일보 편집위원
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 위원
서울대 외래교수
홍익대 외래교수
우리에게 만약 한글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 어떤 문자를 사용하고 있을까?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 한글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새삼 느끼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누구냐고 물으면 많은 사람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세종대왕을 꼽는 것도 이런 까닭일 것이다. 훈민정음 창제 전에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로 표기했는데 한자는 우리말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었으며, 배우기에도 매우 어려운 글자였다. 우리의 독자적인 문자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훈민정음은 1443년에 창제한 우리나라 글자 이름이면서, 훈민정음을 만든 원리와 문자사용에 대한 설명과 용례를 상세하게 담은 책 이름이기도 하다. 훈민정음에는 해례본과 언해본이 있는데, 훈민정음 해례본은 간송미술관 소장의 간송본(안동본)과 당시 연구자의 주석을 포함한 상주본이 있으며, 간송본은 국보 제70호로서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훈민정음 언해본은 한문으로 쓰인 훈민정음해례본 중에서 어제 서문(御製序文)과 예의(例義) 부분만을 언문으로 풀이한 것이다.
훈민정음해례본은 훈민정음 창제의 취지를 밝힌 어제 서문(御製序文), 자음자와 모음자의 음가와 운용 방법을 설명한 예의(例義), 훈민정음을 해설한 해례(解例), 정인지 서(序)로 구성되어 있다. 예의(例義)는 한글을 만든 이유와 한글의 사용법을 세종이 직접 간략하게 설명한 글이며, 해례(解例)는 집현전 학사들이 자음, 모음을 만든 원리와 용법을 상세하게 설명한 글이다. 어제 서문(御製序文)은 한자가 아닌 우리의 독창적인 문자가 필요하다는 자주정신, 한자를 모르는 백성이 제 뜻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애민 정신, 모든 사람이 쉽게 익혀 날마다 편리하게 쓰도록 하겠다는 실용 정신을 담고 있다.
훈민정음해례본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간송 전형필이다. 부잣집에서 태어나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전형필은 서화와 고서, 도자기, 불상, 석탑 등 우리 문화재를 지키는 데 자신의 재산을 아끼지 않았다. 일본이 빼앗아 간 문화재를 되찾기도 했으며, 귀한 유산을 되찾을 때는 흥정조차 하지 않고 제시받은 금액을 훨씬 초월하는 값을 치렀다. 특히 그는 거금을 들여 구입한 <훈민정음해례본>을 늘 베개 밑에 두고 지켰으며, 한국 전쟁 중 피난길에서도 품 안에 넣고 지켰다고 한다. 그는 우리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 연구하는 데 일생을 바쳤다.
1910년대부터 우리는 훈민정음을 한글이라고 부르고 있다. 한글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최초의 언어이며, 만든 사람과 반포일, 글자를 만든 원리까지 명확히 알 수 있는 유일한 문자이다. 세계 문자 중에서도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가장 수준 높은 글자라고 평가받고 있는 한글은 그 명성만큼이나 다음과 같이 많은 장점이 있다.
한글은 같은 위치에서 소리 나는 글자들의 모양이 비슷하며, 가획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소리 나는 위치가 같은 글자들의 모양이 서로 비슷하다. 혀끝이 윗잇몸에 붙어서 나는 소리인 혀끝소리 ㄴ, ㄷ, ㅌ 등이 그 예로서, 로마자 알파벳과 다른 점이다. 소리와 글자의 상관관계까지 생각해서 만든 글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한글은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릿값을 지니고 있어서 로마자 알파벳보다 더 쉽게 읽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글 ‘ㅏ’는 늘 [아]로 소리 나지만, 영어의 ‘a’는 apple, baby, father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애], [에이], [아]와 같이 여러 가지로 소리 난다.
자음(닿소리)은 15세기 훈민정음 당시의 17자에서 현재는 ㆆ(여린히읗), ▵(반시옷), ㆁ(옛이응)을 제외한 14자, 모음(홀소리)은 15세기 훈민정음 당시의 11자에서 현재는 •(아래아)를 제외한 10자로서, 자음, 모음의 개수가 모두 24자이다. 한글은 이 24개의 적은 수의 자음과 모음만으로 수많은 음절을 표현할 수 있다.
특히 한글은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를 하므로 정보를 효율적으로 입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여 전달하는 데 실용적이므로 요즘 같은 정보화시대에는 그 우수성이 더 두드러진다. 그 밖에도 한글은 ‘소리’를 나타내는 문자로, 글자와 소리가 거의 일대일로 대응한다.
한글은 1894년 갑오개혁 이후로 우리나라의 공식 문자로 인정받았고,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 한류 열풍 등으로 해외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고, 한국어과를 개설한 나라도 수십 개국이다. 이는 한글이 짧은 기간 동안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이며, 표음 문자(表音文字)라서 발음 기호가 없어도 말하는 대로 적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영국의 역사학자 존 맨 교수는 ‘한글은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알파벳’이라고 하였고, 미국 하버드대 라이샤워 교수는 “한글은 세계 어떤 나라의 문자에서도 볼 수 없는 가장 과학적인 표기체계를 갖췄다.”라고 했다. 일본 학자로서 저서 <한글의 탄생>으로 한글학회의 ‘주시경학술상’을 받은 노마 히데키는 “한글의 가장 큰 장점이자 매력은 문자 그 자체의 논리성, 그리고 문자의 배경에 있는 지적인 세계…앞으로는 한글과 한국어가 세계의 문화를 선도해 갈 수도 있다고 본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세계가 부러워하는 최고의 한글을 지닌 우리는 한글의 정확한 사용법을 알고 지키고 있을까? 최근에는 맞춤법과 뜻을 무시한 은어와 줄임말 사용 등 한글 파괴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글의 세계화는 한글을 바르게 사용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다. 우리글의 가치를 알고, 한글과 한국어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름다운 우리말을 찾아내고 살려 쓰며, 비속어 사용을 자제하고, 우리말 규범을 지켜야 하며, 공공언어에서 불필요한 외국어 사용을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