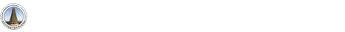훈민정음 보전(保全) 범국민운동을 제안하며…(사)한국인성교육협회 부회장)
박철희 | 조회 876
훈민정음 보전(保全) 범국민운동을 제안하며…
박철희(사)한국인성교육협회 부회장)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지구촌 나라와 국민 가운데 말과 글(言語)을 지닌 숫자는 얼마나 될까? 정확한 통계를 찾아볼 수 없었지만,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닐 것이란 것은 분명해 보인다. 우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한글이란 국민공통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큰 자부심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한류열풍(韓流熱風)과 한국의 경제적 성공신화와 국격(國格) 급상승 등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한글 배우기와 익히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하지만, 막상 한글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시각과 마음은 그리 뜨겁지 않다. 냉랭해지고 있다는 게 정확한 진단일지 모른다. 올(2022년) 한글날 역시, 진정한 국민적‧ 민족적 기념식이라기보다는 일부 인사들과 주한(駐韓) 외국인과 친한파(親韓派) 국가의 어린이와 어린 학생들이 참여하는 ‘한글 쓰고 말하기 경연대회’ 등을 중심으로 한 면피(?)용 내지는 연례행사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명분 세우기에 급급했다는 평가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고 있는 ‘한글의 존재성’은 과연 얼마나 오래 보존될 수 있을지 그것이 궁금해진다. 미래를 염려하는 몇몇 뜻있는 학자와 지도자들이 ‘훈민정음의 위대성과 절대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반성과 계몽 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많은 국민은 ‘훈민정음’이 무엇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훌륭한 민족적 유산이나 문화라 하더라도 계승 발전시키겠다는 국민적 의지가 없다면 그 문화나 유산은 부유(浮游)하다 사라질 수
밖에 없다.
훈민정음(訓民正音)은 1443년 세종대왕께서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세상에 반포하셨다. 여기까지는 예전에 한두 번가량 들어 본 듯한 이야기이다. 세상에 반포될 때 28자였다는 이야기도 들은 것 같다. 하지만 이 판각 원본 28자 가운데 반시옷(∆), 옛이응, 여린 히읗(ㆆ), 아래아(ㆍ)字 등 4글자가 갈라져 현재 ‘우리 손에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정설(定設) 여부를 떠나 매우 중차대한 역사적 사건임에도 흐지부지되고 있다는 건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들리는 소식으로는 ‘실종된 훈민정음의 4글자 원본’은 일본이 있다고 한다. 4글자의 가치는 ‘한글의 100% 유용성 보장’과 직결된다고 한다. 영문 표기를 한글로 바꾸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많은 흠결과 부족함이 드러나고 있는데 만약 실종된 4글자를 범용화할 경우 영문 표기를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웃 나라 중국은 주지하는 바와 같은 동북공정(東北工程)이란 정책적 기치(旗幟) 아래 우리나라 고대역사 가운데 고구려와 발해, 만주와 한반도의 역사를 지우려 하고 있다. 원래는 2006년에 이 공정을 끝내겠다고 했으나 중국의 억지 정책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일본은 사사건건 독도(獨島:다케시마)를 자신들의 땅이라며 역사 왜곡에 혈안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한반도 주변국들의 역사찬탈 침략 행동 등과 연계하여, 그 일차적 국민운동의 하나로 가칭(假稱) ‘훈민정음 보전 범국민운동’을 제안하려 한다. 일본은 ‘훈민정음의 완벽함’을 훼손시키려는 악랄한 목적 아래 판각 원본 4 字를 의도적으로 무단 실어 냈을 가능성이 크다. 식민사관(植民史觀)의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본인들로서는 충분히 하고도 남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다.
범국민운동은 특별히 자라나는 새로운 세대를 중심으로 한 교육개혁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올바른 역사를 교육개혁을 통해 다시 새우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는 핵심동력으로 전면에 내세워야만 한다. 많은 대한민국의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이 우리의 진정한 문화가 무엇이며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스승을 통해 들은 것도 없고, 배운 것 또한 없으니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는 노릇인 셈이다.
필자는 1970대 말 매일경제신문 사회부장 시절, 1년여에 걸쳐 ‘범국민 무재해 1천만 명 서명운동을 노동부와 공동으로 전개했던 적이 있다. 단순한 서명 행사가 아니었다. 수많은 전국의 산업현장에서 재해와 안전의 필요성에 근거한 교육적 캠페인과 함께 현장근로자들의 결속과 다짐을 선포하는 자리였다. 이 결과 우리나라 산업 재해율 0.76% 수준으로 일거에 두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리로 낮아졌다. 재해율의 낮춰짐보다 더욱 가치 있었던 점은 건설 및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수칙 계시 및 구호 복 차, 헬멧과 안전띠 착용, 긴급의료장비 설치 등이 보편화하면서 드디어 ’안전의 기본 틀‘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오늘날의 산업현장에서의 재해 예방과 괄목한 성과는 그냥 얻어진 게 아니다. 훈민정음을 포함한 중국과 일본의 잇따른 역사 왜곡 문제해결에서도 미래에 대비하는 우리의 지혜가 절실하다는 게 필자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