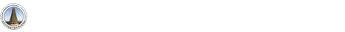‘훈민정음’에서 다시 만나고 싶은 문자(경기도 교육감)
임태희 | 조회 540
‘훈민정음’에서 다시 만나고 싶은 문자
안녕하세요, 경기도교육감 임태희입니다.
오늘 훈민정음을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문자의 소중함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경기 미래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오늘날 ‘훈민정음’의 의미가 더욱 새롭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훈민정음(訓民正音)은 세종대왕 25년(1443년)에 완성해서 3년 동안의 시험 기간을 거쳐 세종 28년(1446년)에 세상에 반포한 문자입니다.
‘ㄱ, ㄴ. ㅁ. ㅅ. ㅇ’ 의 다섯 기본자를 토대로 가획과 이체자를 사용해 17 자음 체계를 이루었고, ‘ㆍ, ㅡ, ㅣ’의 조합으로 11 모음 체계를 구현하여 하늘·땅·사람을 뜻하는 높은 철학까지 담아냈으니 참으로 놀라운 문자 체계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총 스물여덟 글자로 당시 모든 소리를 표기할 수 있었다는 것은 언어학적으로 참으로 위대한 업적이며, 전 세계의 역사를 모두 찾아봐도 유례가 없는 일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훈민정음을 창제하던 당시 총 28자에서 오늘날에는 24자로 여린히읗(ㆆ), 반잇소리(ㅿ), 옛이응(ㆁ), 아래 아(ㆍ) 네 자가 소멸하였지요. 소실 문자 외에도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특정한 조건에서 사용하는 순경음(ㅱ,ㅸ,ㆄ 등)과, 초성에 여러 자음군이 들어간 표기(ㅵ, ㅳ 등)도 있어서 다양한 음운을 표현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만 오늘날에는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는 훈민정음 글모음 출판을 맞아 글을 쓰면서 미래 시대, 국제화 시대에 맞게 외국어를 자유롭게 가능한 한글 표기 방법이 도입되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전에 한글날을 맞아 참석했던 한 행사에서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유명 가수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저에게 훈민정음 창제 시기보다 지금의 한글이 후퇴한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한동안 깊은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San Francisco’를 한글로 표기하면 현재의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샌프란시스코’로 써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원어민에게 영어로 이 지명을 발음해보면 표기와는 다소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Fighting’도 ‘파이팅‘으로 표기하지만, 실제 발음은 ’화이팅’하고 더 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현재 외래어를 현재의 한글 체계로 표현할 때는 [f] 발음을 올바르게 구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은 알파벳 ‘V’나 ‘Z’, ‘Th’ 등의 발음 표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문자로 우리말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의 언어도 세밀하게 표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현재의 체계로는 그러기에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하다(多)/ ᄒᆞ다(爲)’, ‘쓰다(書)/ 다(用)’처럼 우리말의 미묘한 차이도 구분해서 사용했고, 더 나아가 중국의 한자를 원음에 맞게 표기하기 위해 동국정운식 표기 등의 방법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이후로 미묘한 소리의 차이를 섬세하게 표기할 수 있는 글자들이 하나씩 소실되면서 우리말뿐 아니라 외국어 원어에 가까운 말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발음의 편의성을 따르는 언어의 습관이라는 것도 존재하고, 우리의 문자가 외국어를 표기하는 데 필요한 것이냐, 외국어를 구태여 원어대로 표기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 국제와 사회, 미래 시대를 살아가야 할 학생들이 국제화 시대에 걸맞도록 우리의 소중한 문자로 우리말뿐만 아니라 외국의 다양한 말도 자세한 표현이 가능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금번에 훈민정음의 소중함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면서 ‘훈민정음’ 창제 때처럼 오늘날 우리 한글이 세계화 시대에 맞는 언어를 섬세하게 표기할 수 있도록 개선해 보는 것은 어떨지 그 인식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의 언어도 우리 한글로 원음대로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사용했으나 지금은 사라진 네 자(ㆆ,ㅿ,ㆁ,ㆍ) 만이라도 꼭 필요한 곳에 다시 사용할 수 있다면 세종대왕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음성학적으로 우수한 글자인데 지금의 표기로는 그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576돌 한글날을 맞아 오늘날 사라진 훈민정음의 소중한 네 자가 다시 그리워집니다.
2022. 10.
경기도교육감 임 태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