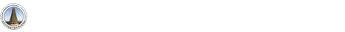훈민정음 정신을 다시 생각하며....(국회의원)
박정 | 조회 569
훈민정음 정신을 다시 생각하며....
박정(국회의원)
말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소통 창구다. 글은 그 말을 부호화 한 것으로, 기록과 전달의 수단이다. 우리는 한국말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한국어를 통해 그 소통을 기록하여 보다 오래 그리고 멀리 전달한다.
세종대왕께서 1443년에 훈민정음을 창제하면서 훈민정음 언해본 서문에서 창제의 취지를 이렇게 밝혔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문·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다.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르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가엾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기에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다.”
세종대왕께서는 훈민정음을 한문이 아닌 우리 글로 뜻을 능히 펴고, 쓰기에 편안케 하고자 만들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글은 어떤 모습인가?
어느 날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MZ세대 신조어를 맞추는 예능프로그램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떠오른다.
‘알잘딱깔센/반모/반박/꾸안꾸/꾸꾸꾸/갓생’
국적을 알 수 없는 말들이 난무하고 있었다.
‘알잘딱깔센’이 뭐냐고 아들에게 물어봤다. 그랬더니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라고 바로 답하는 모습을 보고 더 놀랐다. 이런 언어로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자체가 신기했다. 나는 이제 이들과 어떤 언어로 대화를 해야 할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다. 카카오톡, 텔레그램, 인스타, 트윗터 등 SNS가 발달하면서 말을 최대한 아끼려는 시도가 이뤄지는 것은 시대 흐름인지 모른다. 그러나 말이 그리고 글이 사람과 사람을 잇는 소통 창구인데 이런 말들로 어찌 제대로 소통할 수 있겠는가? 나랏말이 중국에 달라 문자로 서로 통하지 않기에 만든 우리의 한글이 세대가 달라 문자로 서로 통하지 않게 되고 있다는 생각에 슬픔마저 들었다.
또한 ‘알잘딱깔센’이라는 거친 음색이 입으로, 글로 표현하는 우리 정서는 또한 얼마나 거칠어질까 걱정이 앞섰다. 사회가 더 각박해지고, 갈등이 커지고, 개인화 파편화 되는 이 시대가 이런 말과 글의 통용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소는 처음으로 굴레를 쓰고 밖에 나온 모양이다. 새로 엮은 굴레 빛깔은 햇보리같이 신선해 보였다. 소도 그러했다. 털빛이 희여끄름하여 앳된 모습이 가련하게 느껴진다. 어린 계집아이 같았다. 그것도 허약한 계집아이 같이 세상을 신기로워하기보다 두려워하는 표정이었다.”
2008년 세상을 떠난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에 나오는 글이다. 한글의 위대함을 논할 때 소설 토지를 빼고 설명하는 이는 드물다. 굴레의 빛깔을 햇보리에 비유한 그 상상력과. 희여끄름이라는 형용사가 표현하는 그 위대한 어감을 생각해 보자. 이것이 ‘알잘딱깔센’이라는 글에서 찾을 수 없는 글의 품격이다. 그것이 이 땅에 훈민정음이라는 28글자를 만든 세종대왕의 깊은 뜻이다.
언어는 한 나라의 얼이다.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만든 이유는 대한민국의 얼을 기리고, 알리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얼로 고난의 역사를 헤쳐 나와 오늘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세종대왕의 위대한 뜻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가? 우리가 쓰는 글은 백성이 뜻을 펴고, 편한케 하고 있는가?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고,/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비인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짚베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정지용 시인의 ‘향수’라는 시다.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고,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에서 갈등과 반목이 있을 수 있겠는가?
말과 글은 그 사회를 갈등으로도, 화합으로도 이끈다고 생각한다. ‘알잘딱깔센’이라는 말에서 오는 갈등보다는 실개천이 회돌아가는 글에서 오는 화합과 통합의 장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것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지 578년이 지난 지금 다시 세종대왕을 생각하게 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