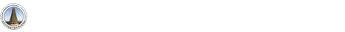우리의 귀한 보물, 훈민정음(예비역 해병대령)
조순근 | 조회 622
우리의 귀한 보물, 훈민정음
조순근(훈민정음 해설사, 예비역 해병대령)
1446년, 조선 4대왕 세종대왕께서 오랜 연구 끝에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뜬 자음 17자와 하늘·땅·사람을 본뜬 모음 11자로 이루어진 28자의 소리글자, 훈민정음을 만들어 반포하셨다.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반포한 목적은 백성들이 쉽게 글을 배워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게 하고, 국왕의 통치이념을 백성들에게 쉽게 전달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였다. 국왕이 군림하며 일방적으로 백성을 통치하던 당시 시대상을 생각해보면 진실로 대단한 애민정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덕분에 우리는 우리 말을 소리 나는 대로 쉽게 쓰고 읽을 수 있는,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글자를 가지게 되었다. 훈민정음 반포를 기점으로 우리 민족문화는 눈 부시 게 발전하였고, 국문학 역시 한자 영향을 벗어나 독자의 영역을 만들어가게 되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최초의 문자는 대부분 상형문자이다. 모양을 본떠 만든 상형문자는 글자 수도 많고, 글자를 보아도 어떻게 읽는지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외워서 익혀야지 만 글을 사용할 수 있었고, 그런 이유로 양반이나 지도층에서나 사용했지 일반 백성은 글을 익힐 시간도 없고 그럴 여유도 없었기에 글을 알지 못했다. 우리도 훈민정음이 반포되기 이전에는 한자를 사용했다. 한자로 이뤄낸 우리 문화 역시 훌륭하고 대단하지만, 한자가 가지는 명확한 한계는 분명하다. 모두가 상형문자인 한자를 사용하거나, 한자를 응용한 가나(일본), 이두(신라)를 사용하던 때에 과학적이고 정밀한 문자, 훈민정음이 탄생한 것이다.
훈민정음의 치밀한 과학적 원리는 정말 놀라울 따름이다. 훈민정음 글자의 근원은 발성 기관의 모습이다. 한글의 자음에서 기본이 되는 것은 ㄱ, ㄴ, ㅁ, ㅅ, ㅇ이다. 이 다섯 글자를 기본으로 획을 하나 더하거나 글자를 포개는 것으로 또 다른 글자를 만들었다. ㄱ은 ‘기역’ 혹은 ‘그’라고 발음할 때 혀의 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습을 본떠 만든 글자이다. ㅇ의 경우 목구멍의 모습을 본뜬 것이다. 세종대왕께서는 훈민정음을 만들면서 소리와 글자의 상관관계까지 깨우쳐 같은 소리에 속하는 자음은 같은 군(群)에 모아두었다. 즉 ㄴ, ㄷ, ㅌ, ㄸ이 그것으로 글자의 형태들을 유사하게 만들었다. 세상의 복잡한 모음 체계는 점 하나와 작대기 두 개로 표현했다. ·, ㅡ, ㅣ에는 각각 하늘, 땅, 사람을 뜻하는 높은 철학이 담겨 있다. 훈민정음은 이런 게 간단한 재료로 가장 많은 모음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런 체계적인 창조성 덕분에 우리 훈민정음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영어를 빌어 혹은 가타카나 히라가나를 사용해 글자를 써야 하지만 자판에 한글을 다 넣어도 자판에 여유가 넘친다.
훈민정음이 한글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은 일제 강점기 때의 일이다. 일제 식민치하에서 민족의 얼과 정신을 지키기 위해 주시경 선생과 한글학자들이 ‘큰 글’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붙였다. 한글로 바뀌어 사용되어 오면서 훈민정음은 사람들의 언어사용 습관에 따라 반치음(ㅿ), 여린 히읗(ㆆ), 아래아(ㆍ), 옛이응(ㆁ) 4글자가 사라졌다. 분명 우리의 소리를 표현하기 위해 만든 문자였는데 근대화, 세계화의 거센 흐름을 거치면서 우리 민족의 기억에서 사라진 것이다. 사라진 4글자와 함께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만드셨던 숭고하고 고귀한 뜻도 희미해진 것이 아닐까 걱정이다. 한글의 본래 모습인 훈민정음의 모습을 되찾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처음 반포되었을 당시만 하더라도 천한 글자라 하여 ‘언문(諺文)’이라 불렸고, 양반들의 배척을 받으며 주로 평민이나 여성들이 사용하던 훈민정음은 이제 우리의 위대한 보물이 되었다. 세계 문자 가운데 유일하게 만든 사람과 반포 일을 알고 있으며, 글자의 원리까지도 알 수 있는 유일한 문자.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애민정신의 철학까지 담고 있는 문자. 훈민정음. 그 가치를 인정받아 훈민정음 원본인 ‘훈민정음 해례본’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자랑스러운 우리의 유산.
최근 들어 훈민정음의 우수성을 우리 국민도 잘 알게 된 것 같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훈민정음을 빌어 언어를 배우는 사례도 늘어나고 외국인이 한글 티셔치를 입는 모습을 보며 우리 한글이 자랑스러운 문자라는 사실을 느끼고 있다. 우리 것은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고 다듬어 나가야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해 준다. 바르고 고운 말, 어법에 맞고 올바른 말을 쓰며, 사라진 4글자를 회복하여 우리의 귀한 보물 훈민정음을 더욱 아끼고 사랑했으면 좋겠다. 한글날도 이제는 ‘훈민정음의 날’로 이름을 바꿔 우리 글의 본래의 가치를 더욱 깊이 들여다보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