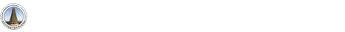하늘과 땅과 사람이 감탄하는 문자, 훈민정음(한국소설가협회 이사장)
김호운 | 조회 444
하늘과 땅과 사람이 감탄하는 문자, 훈민정음
김호운(소설가·한국소설가협회 이사장)
우리는 매일 공기를 마신다. 공기를 마시며 숨을 쉬어야 한다. 그래야 공기 속의 산소를 흡수하여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함에도 숨을 쉬면서 ‘공기를 마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렇게 생각하며 숨 쉬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를 이상하게 볼지도 모른다. 매일 반복하는 일상이고, 공기가 없는 세상을 만나지 못한 터라 감사하는 마음이 그만큼 무디어졌다. 만약 공기가 사람처럼 감정을 가졌다면 은혜를 모른다며 화를 낼 일이다.
우리글 한글도 그렇다. 물론 생명과 연결된 공기와 비교하는 건 좀 억지스럽긴 하지만, 그에 버금간다는 의미다. 한글은 우리가 날마다 생각을 전달하고 일상을 기록하며 또 창작 활동을 하는 소중한 문자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말을 배우고, 문리를 깨치는 나이 때부터 한글을 익혀 일상으로 사용한다. 그래서인지 공기와 마찬가지로 평소 한글을 사용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새기는 분은 많지 않다. 한글은 외국어처럼 엄격한 문법을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쉬 익혀서 사용하며, 문법에서 조금 벗어나도 의미를 전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귀한 글이라는 생각이 무디어졌는지 모른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 한글은 융통성이 있어서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처럼 까다롭게 문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쓰고 읽는 데 지장이 없다.” 처음에는 이 말이 우리 한글을 비하하는 말로 들려 좀 언짢았으나, 늦깎이로 대학에 들어가서 8학기 동안 중국어를 공부하면서 이 말의 의미를 새삼 떠올렸다. 사실 우리 한글을 사용하는 분들 가운데 문법을 정확히 아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다. 이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이거나 관련 직업에서 일하는 분들 외에는 정확하게 문법을 알고 우리글을 사용하는 분은 많지 않다. 작가들 가운데도 맞춤법을 틀리게 사용하는 분들이 더러 있다. 그래도 별문제 없이 자유롭게 의사를 전달하고 창작 활동을 한다. 그래서 우리 한글이 융통성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나 싶다. 영어나 중국어는 어순이 다르거나 조사 하나 잘못 사용하면 엉뚱한 의미가 되지만, 한글은 문장이 어색할 수는 있을지라도 의미가 전달된다. 그렇다고 한글이 문법을 무시하고 사용해도 되는 문자라는 뜻은 아니다. 우리 한글이 그만큼 폭넓은 사용층을 의식하고 만든 우수한 문자임을 강조했다.
중국어를 공부하면서 ‘뜻글자(表意文字)’와 ‘소리글자(表音文字)’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다. 중국어는 뜻글자이고, 우리 한글은 소리글자다. 이 말은 귀에 딱지가 앉게 들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 두 문자를 제대로 구별해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다. 말하자면 뜻글자는 ‘뜻은 있되 소리가 없고, 소리글자는 소리는 있되 뜻이 없다.’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이다. 풀어보면, 뜻글자인 한자(漢字)는 소리를 만들어 주어야 비로소 문자가 되고, 소리글자인 한글은 뜻을 붙여 주어야 문자가 된다. 그래서 중국어는 우리 한글과 달리 영어처럼 소리를 표시하는 기호가 따로 있다. 주음부호(注音符號)라는 발음기호인데, ‘ㄅ ㄆ ㄇ ㄈ’ 이런 상형문자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다. 한자의 소리를 알기 위해서는 성모(聲母; 자음) 21개, 운모(韻母; 모음) 24개로 나뉜 이런 주음부호를 모두 외어야 한다. 이 자모(字母)만 외우면 해결되는 게 아니다. 수천 자나 되는 한자는 그 음이 제각각 다른 성모와 운모의 조합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글자마다 소리 기호를 일일이 따로 외어야 한다. 우리 한글처럼 일정하게 자음과 모음의 조합만으로 소리가 되는 것과는 다른 규칙이다. 현재 이 주음부호는 타이완에서만 적용하고, 중국에서는 1958년에 제정된 로마자를 이용한 성모 21개 운모 36개로 된 한어병음(漢語拼音)을 발음기호로 사용한다. 중국인의 문맹을 퇴치하고, 외국인들이 중국어를 쉽게 익히도록 주음부호 대신 만든 발음기호다. 주음부호든 한어병음이든 뜻글자인 중국어는 글자의 소리를 알기 위해 글자마다 부여한 발음기호를 일일이 따로 익혀야 한다. 여기에다 4개의 높낮이로 된 성조(聲調)까지 배워야 한다. 발음체계가 매우 복잡하다. 덧붙이자면, 중국어의 발음체계 정리는 1958년에야 이루어졌으니 그 역사가 겨우 60년밖에 안 된다. 한글은 이보다 훨씬 앞서 1443년에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1446년에 반포했으며, 이때 발음체계까지 함께 갖추었으니 위대한 문자가 아닐 수 없다.
우리 훈민정음은 자음 17개와 모음 11개, 모두 28개 자모만 알면 글자의 모양뿐만 아니라, 소리까지 한꺼번에 익힐 수 있다. 한자처럼 문자마다 다른 조합으로 된 발음기호가 있는 게 아니라, 자음과 모음만으로 구성된 문자에 이미 발음이 부여되어 있어 중국어처럼 글자마다 발음기호를 따로 외울 필요가 없다. 물론 소리글자라 그 글자에 지어 준 뜻을 따로 익히는 과정이 필요하나 앞서 설명한 중국어와 비교하면 정말 익히기 쉽다.
‘세종대왕 문맹 퇴치상’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필자도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고개를 갸웃했다. ‘세종대왕’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서 혹시 한글학회나 국립한글박물관 같은 곳에서 시행하는 상 이름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문맹 퇴치상’이라는 말에서 다시 막혔다. 문맹을 퇴치하고 상까지 수여해야 할 만큼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높지 않다.
그런데 정말 이런 상이 있다. 그것도 세계인을 상대로 수여하는 상 이름이다. 유엔 기구인 유네스코(UNESCO)에서 1990년부터 해마다 세계에서 문맹 퇴치에 공이 큰 사람들에게 ‘세종대왕 문맹 퇴치상(King Sejong Literacy Prize)’이란 이름의 상을 주고 있다. 이 상의 명칭에 세종대왕이 들어간 것은 세종대왕께서 만든 우리 한글이 가장 배우기가 쉬워 문맹자를 없애기에 좋은 글자임을 세계가 인정했기 때문이라 한다.
현재 세계에서 사용하는 언어 종류가 7천여 개고, 이 가운데 문자로 상용할 가능성이 있는 언어는 300여 개며, 현재 상용하는 문자는 우리 한글을 포함하여 28개뿐이라고 한다. 우리 한글이 이처럼 위대한 문자다. 그뿐만 아니다. 상용되는 이 28개 언어 가운데 우리 한글이 가장 배우기 쉽게 과학 원리로 만들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제정한 이 상에 훈민정음을 만든 세종대왕의 이름을 넣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러함에도 정작 한글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는 세종대왕이 만드신 훈민정음이 이처럼 위대한 문자임을 별로 실감하지 않는다. 모국어여서 그렇기도 하지만, 외국어를 배울 때처럼 까다롭게 문법을 공부하지 않아도 익히고 사용하는 데 별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글이 다른 나라 문자에 비해 ‘융통성이 있다’는 말로 설명하기도 한다.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는 문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어순이 바뀌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되지만, 우리 한글은 문법 체계가 조금 흐트러져도 뜻이 통한다. 한글도 엄연히 일정한 규칙에 따르도록 하는 문법이 있지만, 따로 배우지 않아도 잘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리라.
왜 한글이 배우고 사용하기 쉬울까. 우선 우리 한글은 간단한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자음과 모음을 합하여 모두 28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 28자는 천지인(天地人), 즉 하늘[ㆍ], 땅[ㅡ], 사람[ㅣ]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소리를 내는 사람의 구강 구조를 여기에 적용하였다고 하니 그야말로 과학을 바탕으로 하여 만든 문자다. 더구나 『훈민정음』에서 세종대왕이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서로 뜻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기 뜻을 전하지 못하는 이가 많아 이를 안타깝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들었으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편리하게 쓰도록 하고자 하였다”고 밝힌 것처럼, 한글은 우리 국민이 사용할 문자라 쉽게 익힐 수 있게 평등과 박애 정신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더 위대하다. 유네스코가 문맹 퇴치를 위해 노력한 사람에게 주는 상 이름에 세종대왕을 명기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