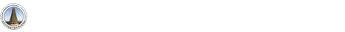훈민정음 창제한 뜻을 생각하다(태전사 주지)
석도일 | 조회 599
훈민정음 창제한 뜻을 생각하다
석도일(태전사 주지)
훈민정음(訓民正音)은 1443년(세종 25년) 창제하였다고 하니, 2022년 현재로 보면 500년이 더 되었다. 한글을 창제한 뜻은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말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까닭에 어리석은 백성이 이르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그 뜻을 실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라.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로 씀에 편안하게 할 따름이니라.”라고 하였다.
한글을 언문(諺文)이라고 하거나, 속음(俗音)이나, 속자(俗字)라고도 하였다 한다. 그렇지만 간경도감을 설치하여 한글 발전에 대한 노력의 결과, 한글을 사용한 불교 경전의 언해본과 유교의 사서삼경의 언해본 등이 간행되었고, 시조도 한글로 짓고 유포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훌륭한 문인들의 문집과 왕조실록은 한자로 기록되었다. 한글로 기록된 자료가 있었지만, 한자로 된 자료에 비할 수 없이 적었다.
최근 ‘방탄소년단’과 ‘오징어 게임’, 그리고 ‘기생충’ 등 한국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다. 노래를 부르거나, 영화나 드라마를 보기 위해 많은 외국인이 한글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한다. 뉴스 보도 중에 “'복면 가왕' ‘히든 싱어' 포맷 유럽에 팔렸다”라는 기사를 읽었다. TV에서 이 프로그램을 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복면 가왕이나 히든 싱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될 것이다. 한국 영화 기생충(寄生蟲)은 대만에서는 기생상류(寄生上流)로 번역해서 상영하였다고 한다. 영화 제목이나 노랫말이 명실상부(名實相符)해야 감동적이고 오래 기억될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지인 두 분은 아주 특이한 점이 있다. 한 분은 어떤 문제나 사물을 설명할 때 순수한 우리말로 설명하고, 또 다른 한 분은 영어와 전문용어로 설명한다. 때와 장소, 청중의 수준에 따라서 눈높이를 맞추어 말하고 글을 써야 할 것이다. 외래어나 외국어를 사용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무분별한 외래어, 외국어를 사용하게 되면, 의사소통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나아가 한글을 훼손하게 될 수 있다.
우리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세계화된 시대에 살고 있다. 외래어는 국립국어원이 제시한 외래어 표기법을 참조하여 편리하게 사용하고, 외국어를 배운다면 그들의 역사, 문화, 사상도 함께 배워 의사소통이 잘되면 더 좋겠다.
1950년대의 “단장의 미아리 고개” 노랫말과 2022년대의 “신 미아리 고개”의 노랫말과 선율은 매우 대조적이다. 한글로 적은 노랫말이지만, 그 시대의 언어, 그 시대의 선율로 희로애락을 표현한다. 한글이란 단순 글을 쓰기 위한 도구가 아닌 생각을 담을 수 있는 중요한 도구다. “국립한글박물관이 준비한 <노랫말-선율에 삶을 싣다>는 선율을 타고 우리 삶을 실어 나른 대중가요 노랫말의 발자취와 노랫말에 담긴 우리 말과 글의 묘미를 소개하고자 한다.”라는 홍보 기사를 보았다. 이렇듯 한글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홀로 아리랑’, ‘만남’, ‘향수’ 등등 이런 노래는 지금 불러도 좋지 아니한가.
고려대장경은 한문으로 기록된 세계적인 보배이다.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한글 대장경으로 다시 태어났다. 불교 신도들이 많이 독경하는 한문 천수경이 있다. 이제는 한글 천수경을 운율에 맞추어 독경한다. 더 나아가 천수경의 내용을 요약하여 ‘천의 눈 천의 손’이라는 노래로 만들어져 부르기도 한다. 한글 독경과 한글 노래가 감동을 준다. 이는 한글 덕분이다.
태전사에는 신도들로 구성된 한글 독경반이 있다. 올해 9월 30일, 속리산 법주사에서 부처님 말씀 중 ‘마음의 주인이 되어라’라는 내용으로 신도들이 목탁과 북의 선율에 맞추어 한글 독경을 시연하였다. 독경하는 사람과 독경을 듣는 사람 모두가 한문으로 독경할 때에 비해 훨씬 좋다고 한다. 이 또한 한글이 우리에게 주는 값진 선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