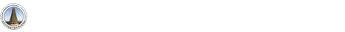훈민정음을 말한다(국제펜한국본부 대구지회장)
손수여 | 조회 549
훈민정음을 말한다
손수여(국제펜한국본부 대구지회장)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글]’이요, ‘한글’의 다른 이름이다. 한글은 과학적이고 독창성이 있는 문자이다. 우리 한글의 우수성은 누구나 배워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실용성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 한국어를 외국어로 가르치거나 공용어로 쓰고 있는 것만 보아도 한글의 우수성이 입증되고 있다.
세계에는 약 6500여 개의 언어집단이 있고 약 3,000여 종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기는 하지만, 엄격하게 보면 23개 언어만이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사용되지 않은 많은 언어는 실용성이 없기 때문이리라. 이 중 한국어는 아시아는 물론 미국, 유럽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도 외국어로 배우는 국가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미국과 캐나다,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한국어 인기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워싱톤 D.C의 한국대사관 산하 총영사관 총(?) 7개 기관에 한국어반을 구성하여 792개 학교에 4만여 명 학생과 한국어교사 6,900명이 3억3천여 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반을 의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김우영 2021:23 한글문학). 이 밖에도 지구촌이 한류를 타고 한식, 김치, 의복, 드라마 영화, 음악 등 다양한 문화를 통해 확산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최근에는 영화계의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등도 한류 확산에 크게 한몫하고 있다. 국민정책평가신문(2022.8.16.)에 의하면 제20회 재외한국어교육자학술대회에 몽골, 베트남, 에디오피아, 아제르바이잔, 중국, 태국 등 42개국 한국어교육 전문가 500여명이 “한국어 교육의 현재와 미래”란 주제로 발표하고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다녀갔다.
국민 소득이 높고 문화 선진국일수록 그에 적합한 민족의 정체성이 요구된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족에게 역사의식,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중국은 왜, 동북공정을 빌미로 이웃 나라의 역사를 날조하고 왜곡하려고 하는가? 역사를 온전히 보존하고 바르게 지키려는 민족과 국가는 자주 국가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주정신이 있어야 하고 깨어 있는 민족이어야 한다.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다. 자주정신이 없으면 언제 주권과 영토를 빼앗길지 모르는 것이 오늘의 국제정세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힘을 길러야 하고 이는 개인이나 국가도 마찬가지다. 이럴 때일수록 바른 말, 바른 글은 민족의 양심이고 국력의 척도이다. 대한민국은 문화강국이 되어야 한다.
세종대왕은 우리말을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할 수 있는 우리 문자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를 뜻하는 훈민정음은 이 문자를 만든 취지가 들어 있는 『훈민정음예의본』과 글자의 원리, 사용법 등을 밝힌 『훈민정음해례본』에 담겨져 있다. 훈민정음은 우주의 원리, 곧 자연과 사물의 근원인 ‘하늘, 땅, 사람’의 형태를 본떠 모음(홀소리)의 근본으로 삼고 사람의 발성 기관을 본떠 자음(닿소리) 글자를 만들었다. 그 기본 글자는 자음에 열일곱 자와 모음 열한 자 모두 스물여덟 글자였다. 그러나 시간의 변천에 따라 모음 한 자와 자음 세 글자가 쓰이지 않고 현재는 스물네 자가 사용되고 있다.
世宗御製 訓民正音
國之語音。異乎中國。與文字不相流通。故愚民。有所欲言而終不得伸其情者。多矣。
予。爲此憫然。新制二十八字。欲使人人易習。便於日用耳。
세종어제 훈민정음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르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노라./
내가 이를 위해 가엽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노니/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 것이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어제 훈민정음 서문’ 가운데 첫 구절부터 내용을 꼼꼼히 챙겨해 볼 곳이 있다. 바로 “국지어음 이호중국國之語音。異乎中國.”이다. “나라의 말이 중국에(과) 달라”의 내용 중 ‘중국’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뇌가 없었다. 훈민정음 예의본 어디에도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이 ‘중국’을 그대로 옮겨 쓰고 있다. 시대적 상황으로는 당연히 ‘명’나라이고 수도는 ‘남경 南京’이었다. 그럼에도 당시의 ‘명’나라를 ‘중국’으로 표기할 까닭은 전혀 없는 것이다. 더구나 ’중국‘이란 국호를 쓰는 나라는 없었다. 그 당시 한문에 빼어난 집현전 학사들이 그것을 모르고 썼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편 훈민정음 창제 당시인 세종25년(1443년)의 시대적 상황은 교통수단이 좋지 않던 시대였다. 따라서 나라 내에서도 교류와 소통이 어려웠고 특히 지역 간 언어 사용의 격차가 심하였기에 ‘나라 가운데서도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라고 해야 이치에 맞는 것이다. 국가 구성 요소의 주체인 국민(백성)을 생각하는 ‘위민정책’과 ‘실용주의 정신’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역사성, 정체성 있게 밝혀진 문자가 어디 또 있었던가. 그 특징을 살려 쓴 필자의 다음 시 한 수로 마무리를 하고자 한다.
나라님이 창조하신 으뜸글 훈민정음/ 대대손손 지키고 가꿔온 우리 문자/
사람의 목구멍, 입술과 혀의 모양,/하늘 땅 사람을 본뜬 으뜸 글자가/
예서 말고 이 세상에 어디 또 있으랴/
누구나 쉽게 배워 쓰기에 편한 글/소리대로 쓸 수 있고 못하는 표현 없는/
한글은 우리의 얼이요 겨레의 자랑/나라 말이 오르면 국격이 높아지네/
한류 열풍 지구촌이 한글로 넘실넘실/
세계인이 함께 쓰는 공용어가 되는 날/그 날의 기쁜 물결이 온 세계를 출렁이네.//
손수여 <지구촌, 한글로 넘실넘실> 전문-
- 이전글 노 교육자의 고백(전 함양군 교육장)
- 다음글 훈민정음(삼성전자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