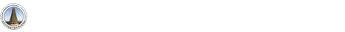‘엉겅퀴’라고 적을 수 있는 문자 훈민정음(영농법인 임실생약 대표)
심재석 | 조회 611
‘엉겅퀴’라고 적을 수 있는 문자 훈민정음
심재석(영농법인 임실생약 대표)
‘엉겅퀴’는 국화과의 여러해살이풀인데 식물 전체에 하얀 털이 나있으며, 보랏빛에 삽주 비슷하게 생긴 꽃으로 “독립심이 왕성한 사람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앞날을 정확하게 내다보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보라색 꽃이 예쁘게 피는 풀이지만 가시가 엄청 많아 ‘가시나물’이라 불리고 피를 엉겨 지혈한다하여 엉겅퀴라고 하는 이름은 순 우리말로 ‘큰 가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엉겅퀴를 꺾으면 하얀 즙이 나온다고 해서 유럽과 북미에서는 밀크시슬(Milk thistle)이라고 이름 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thistle이라는 단어이다.
스코틀랜드의 국화(國花)를 thistle이라고 하는데, 바로 엉겅퀴라는 뜻이다. 이 thistle의 발음기호를 적어보면 [ˈθɪsl]인데, 미국식 발음과 영국식 발음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이 꽃 이름 앞의 철자인 th의 발음은 this에서는 [ðɪs]이고, the에서는 [ðə;]나 혹은 [ði]로 발음되어 동일한 표기 th의 발음이 제각각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세종대왕 덕분에 전라도에서도 ‘엉겅퀴’라고 적고, 제주도에서도 ‘엉겅퀴’, 평양에서도 ‘엉겅퀴’라고 적고 ‘엉겅퀴’라고 읽을 수 있는 행복을 누리고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정인지가 서문에 표현한 것처럼, 바람 소리, 학의 울음소리, 닭의 홰치는 소리, 개 짖는 소리도 모두 전하께서 새롭게 만든 스물여덟 글자로써 적을 수 있다고 하였듯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정확한 표음문자인 훈민정음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그런데, 2022년 대한민국은 세종대왕이 만들어 주신 훈민정음을 자랑스러워하기보다는 파괴하지 못해 안달이 난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필자의 지나친 염려일지 모르겠다.
아파트의 이름은 ‘퍼스티지’, ‘더포레스트’, ‘에듀’, ‘파크’ 등 국적 불명의 이름이 난무하고, 거리의 간판은 더욱 가관이어서 고유의 한글 이름까지 영어로 고쳐 사용하는 상점들뿐만 아니라 카페의 간판은 물론 안내판까지 영어로만 적혀 있는 등 정체불명의 외래어 간판이나 외국어 간판이 점령하여 이곳이 한국인지 아니면 미국인지 헷갈릴 정도가 되어버린 것 같다.
임실의 한적한 시골마을에서 엉겅퀴를 재배하면서 엉겅퀴의 약효를 연구하여 다양한 엉겅퀴 관련 건강식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는 필자는 국민의 건강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생활하면서 다양한 단체의 요청에 따라 전국적으로 강연하러 다니다보면 초청자와 차 한 잔을 나누거나 때로는 홀로 커피 한 잔 마시려고 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낯선 외국어 단어나 표현으로 소통에 애를 먹어 당황스러웠던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춰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앞서 제기한 외국어 간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부터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을 앞장서고 있는 것 같아서 씁쓸한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
정겨웠던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경찰 파출소는 ‘치안센터’, 119 소방 파출소도 ‘119 안전센터’로 바뀌었고, 서울지하철공사는 아예 회사 명칭을 ‘서울 메트로’로, 한국철도공사는 ‘코레일’로 바꾸는 등, 우리 공공기관들은 앞 다퉈 외래어 바꾸기 시합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훈민정음이 낳은 한글의 우수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은 명백한 문자 사대주의이기에 국제화를 핑계로 너무 쉽게 우리의 말과 글자를 포기하고 있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세종대왕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