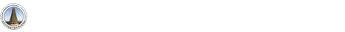곳간에 은과 금이 그득하옵니다.(대구 삼육초등학교 도서관 사서)
김둘 | 조회 577
곳간에 은과 금이 그득하옵니다.
김둘(대구 삼육초등학교 도서관 사서)
감쫑염, 굥딸육, 검반자, 냠룡웅, 흉자둥, 걀셧흉, 미쭝후, 인천집, 악자흥, 감자우유, 항영효, 뵹혓종, 옥슝염, 몽룡화힝, 넘돈양, 익공초, 잉윳초, 광택근….
초등학생들 이름이다. 한 글자당 하나씩의 모음이나 자음만 남겨두고 새로운 자음과 모음을 넣었다. 어린이들은 완전히 다른 글자로 변하는 자신의 이름이 신기해서 눈을 반짝반짝한다. 우리가 현재 쓰는 한글 자모 24자로 어떤 이름이든 만들 수 있고 어떤 말이든 쓸 수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아이들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한다. 전국의 개성 있는 사투리와 낯선 제주도 방언조차도 표기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아이들은 다시 한 번 놀란다.
아이들은 친구 이름도 고구려 식으로 지어달라고 부탁했다. 그 친구 이름으로 만든 고구려 식 이름은 ‘전남친’. 이야, 정말 멋지구나. 전 여자 친구는 없을까? 그리고 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 검반자, 안녕? 인천집 너 오늘 좀 늦었다. 악자흥, 글씨 조금 더 바르게 쓰자….”
나는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국어 숙제를 하면서 울었던 적이 있다. 담임 선생님께서 자기 이름 열 번씩 써오라며 가로 세 칸 세로로 10줄 되는 종이를 나누어 주셨다. 그때까지만 해도 종이가 귀할 때라 선생님이 나누어 주는 종이를 애지중지하며 집에 와 숙제하려는 찰나, 나는 숙제를 제대로 못 해갈 게 뻔하다는 걸 알았다. 내 이름은 ‘둘’, 성은 ‘김’. 합해봐야 두 자밖에 되지 않으니 세 칸을 채울 수가 없었다. 울음소리를 듣고 방에 들어온 어머니는 사연을 들으시고는 세 칸 중 가운데를 띄우면 된다고 알려주셨지만 나는 막무가내로 떼를 썼다. 이름을 바꿔 주지 않으면 울음을 멈추지 않을 듯 자지러지자 등짝을 후려치시면서 이름을 갑자기 어떻게 바꾸냐고 소리치셨다. 나는 악다구니를 하면서 ‘김둘이’로 바꿔 달라고 했다. 하지만 그 이름도 한자 뜻이 없으며 부르기는 더 애매하다는 걸 몰랐다. ‘김둘이’역시 아무 뜻도 없으며‘둘이야’로 불려 ‘둘’일 때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세월이 한 참 지났을 때 나는 또 한 번 큰 충격을 받았다. 어느 교장 선생님께서 아들 동생 봤냐고 묻는 것이다. 집에 딸이 많은 걸 어찌 아시냐 여쭈었더니 예로부터 딸 많은 집에 아들을 보려고 ‘둘’이라는 글자를 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둘러 둘러 다음에는 아들 낳으라’는 뜻의 부적(符籍)같은 이름이라는 것이다.
요즘은 한글 이름을 흔히 볼 수 있으며‘사람 이름 둘(乧)’이라는 내 이름 한자를 한글 파일에서도 찾을 수 있다. 게다가 이름 예쁘다는 소리도 더러 듣는다. 다들 예명인 줄 알고 있다가 실명이 이렇게 예쁘니 좋겠다고 부러워한다. 어쩌면 그 시절에 누군가가 내 이름을 고구려 식으로 멋지게 이름을 불러 주었더라면 나는 좀 더 씩씩 자랐을지도 모른다.
학생들이 자기 이름을 해체하며 고구려 식으로 이름을 바꾸고 있을 때 나도 이름을 쓴다. 김둘... 김록... 민록…. 만들록…. 민들레…. 아, ‘민들레’ 좋구나. 싱그러운 이름이다. 고백하자면 그날 나는 부모님보다 세종대왕님을 더 많이 원망했고 훈민정음을 저주했다. 나를 이렇게 만든 건 모두 훈민정음 탓이라는 게 여덟 살의 내 절대적 믿음이었기 때문이다.
허나, 훈민정음이 내게 가져다준 특이한 이름과 오늘 학생들과 글자 놀이하는 이 순간이 참 좋다. 만약 세종대왕이 곁에 계셨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이렇게 말씀 올렸으리라.
“훈민정음을 고구려씩 이름으로 지어 드리겠사옵니다.…. ‘곳간은금’ 어떠하옵니까? ‘곳간은 금’이라는 뜻도 되고 ‘곳간에 은과 금이 많다’라는 뜻도 있사옵니다. 새로운 글을 곳간으로 보고 은과 금을 우리 백성으로 보시옵소서. 이 글 훈민정음으로 인해 우리 민족이 자손만대 빛날 것이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