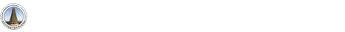임금 세종과 인간 세종(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 이사)
박화연 | 조회 553
임금 세종과 인간 세종
박화연(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 이사)
“소리 나는 대로 적을 수 있는 글자가 있어야 한다. 또 그것은 누구나 쉽게 익혀서 쓸 수 있는 글자이어야 한다.”
이 문장부터 세종대왕이 백성을 이해하고 아껴주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마음씨 덕분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 수 있었지 않을까?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 이사로 활동하면서도 <소설로 만나는 세종실록 속 훈민정음>을 읽기 전에는 훈민정음이 어떤 노력으로 만들어졌는지 정확히 알고 있지 않았다. ‘108인의 훈민정음 글모음’ 원고 요청을 받고서 무엇을 써야 할지 무척 망설이다가 꺼내 든 두껍지 않은 이 책을 읽으면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상황이 눈에 그려지 듯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컴퓨터 앞에 앉을 수 있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을 있게 한 훈민정음 28자의 자음과 모음, 글자 하나하나에는 세종대왕의 정성이 마치 자식을 돌보는 부모님처럼, 내 모든 것을 쏟아서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처럼 바로 눈 앞에서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하루도 쉬지 않고 글자를 어떻게 만들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세종대왕의 모습과 책을 통해 만나게 된 인간 세종의 모습은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
“개구리가 못에서 개굴개굴 우는데 처녀 아이가 돌을 던지거나 퐁당 하는 소리가 울리고, 노을 진 하늘에서는 까마귀가 까옥까옥 울며 지나간다.”
이제서야 미국에서는 동물들의 울음소리를 ‘미야우’, ‘오잉크’, ‘바우와우’라고 적지만 우리나라는 동물들의 울음소리를 적을 때 귀에 들리는 대로 ‘야옹’, ‘꿀꿀’, ‘멍멍’ 하고 적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바로 소리나는 대로 글을 쓸 수 있도록 지혜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문자를 쓰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
세종대왕이 고된 노력으로 만든 초성자는 소리가 나는 부분의 원리에 따라 어금닛소리, 혓소리, 입술소리, 잇소리, 목구멍소리 이렇게 다섯가지 소리를 통해 만들었다. 관심이 있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세종대왕도 소리에 관심을 가지다보니 이런 글자가 나온 것이지 않을까?
두 번째로 만든 중성자는 하늘, 땅, 사람을 생각해내어 만들었다. 이를 통해서 훈민정음의 모음은 쓰기 쉽도록 가장 간단한 점과 선으로 만들어졌다.
무엇인가 문제를 찾고 생각하기는 쉽지만 그것을 실천하기란 무척 힘이 든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노력해야 하지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게 되는 일이 많다. 하지만 세종대왕이 포기하지 않고 온갖 병마와 싸우면서 어리석은 백성들을 위해 훈민정음 28자를 완성하였지만 최만리 등 사대 모화에 젖은 신하들은 새로운 문자의 창제를 반대한다.
세종대왕은 신하들에게 화를 내고 벌을 주기도 하지만 단순히 자신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신하들이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백성의 어려움을 알지 못하는 것에 화가 난 것이다. 1446년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훈민정음>이 반포되고 직접 첫 문장을 쓴다.
“나라말이 중국과 달라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사람으로 하여금 밝게 익히어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할 뿐이다.”라고 쓴 세종대왕은 어떤 기분이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