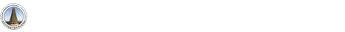한글도 진화가 필요한 때이다.(사)한국시조협회 부이사장)
김달호 | 조회 523
한글도 진화가 필요한 때이다.
김달호(사)한국시조협회 부이사장
우리나라의 땅은 작지만, 세계 10대 강국반열에 서 있다. 거기다가 우리 말과 독창적인 글이 있어서 어떤 외국인을 만나도 큰 자긍심을 갖고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해외여행 중에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은, ‘일본인이냐?’ 아니라면, 그다음은 ‘중국인이냐?’라고 묻곤 했다. 어떤 이는 그럼 필리핀인이냐고 묻기까지 했다. 때로는 말과 글이 일본어를 쓰느냐? 중국어를 쓰느냐? 묻는 사람도 있었다. 78년 북아프리카 수출시장개척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던 때라서, 3년동안 매일 외국인과 만나 상담을 했다. 나는 우리 말과 글이 우수하고 독창적이고 배우기도 쉽다는 설명을 했다. 때로는 한글로 이름을 써 주곤 했는데, 글자가 쓰기가 너무 쉬워 보인다며 따라 써 보기도 했다. 88올림픽이 있기 전까지는,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말을 쓰는지 모르는 외국인이 많았다.
<훈민정음해례본>이 국보 70호로 지정되고 1997년 10월 1일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어 우리의 어깨를 으쓱하게 했다, 2013년 니카라과의 고도 그라나다에서 열린 세계시인대회에 참석하는 길에 수도 마나과 대학에서 우리 말과 스페인어로 시를 낭독하며, 한글이 쓰기 쉽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하니 큰 박수를 받아 마치 내가 상을 받는 기분이었다.
우리 글 중에서 순치음이 없어서 외국어를 배울 때 어려움이 많은 경우가 있다. 순치음은 거의 모든 언어가 가지고 있는 매우 흔한 음가이지만 한국어, 일본어, 타갈로그어(필리핀), 마인어(말레이-인도네시아)에만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인에게 ’F‘음가를 어떻게 낼 수 있느냐고 물으면, 숨을 크게 내쉬는 소리라고 한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다.
영어는 이제 외국어가 아니라 세계공용어가 되었다고도 한다.
한글은 28자로 태어나서 1933년 조선어학회가 「한글맞춤법통일안」을 만들면서
1) 아래아(ㆍ), 2)옛이응(ㆁ), 3) 여린히읗 (ㆆ) 4) 반치음 (ㅿ)이 사라지고 24자가 남았다. 시대의 요구에 따라 사라지기도 하고 진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한글도 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외에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만나는 외국인들의 대부분은 이 단어 때문에 외국인이 무척 당황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어느 날 서울 시내 큰 호텔에서 유럽에서 온 손님에게 나의 동료 한 사람이 ‘먼 길 오시느라 수고가 힘드셨지요’라고 표현한다는 것이, ‘You must be very tired because of long (long을 wrong으로 발음) flight’라 한 것으로 들렸던 것 같다. 마치 ‘너 잘못 온 것 같아!’로 들릴 수 있어서 바로 수습했던 예도 있다.
식당에서 생선을 달라고 하면서 ‘fish’를 ‘pish’로 발음한다면 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 한글이 영어와 특별히 다른 음가와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이 영어와 ‘R’과 ‘F’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R’자와 ‘F’에 대응하는 한글을 만들면 좋겠지만 우선은 . ‘R’ 음은 ‘ㄹㄹ’ 로 병서하고 ‘F’ 음가는 ‘ㅍㅎ(영어식 ph’)로 병서하면 자판을 그대로 두고 그 기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ㅍ’아래에 아래아(ㆍ)를 붙여 만들 수도 있겠지만 자판을 재구성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리라 본다. 우선 쉬운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우리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말이 있듯이, 우리 문화를 세계화하는데, 가장 먼저 알려야 할 것이 우리의 고유의 전통 시인 ‘시조’라고 본다. 겨레의 시로 일컬어지는 시조는 우리말 가락이 보통 3⸱4조이다. 고시조로 이어져 오는 것이 약 5천 수로 대부분 그 가락이 3⸱4⸱3⸱4 3⸱4⸱4⸱4 3⸱5⸱4⸱3 율격을 담고 있다. 시조를 세계화하는 것이라고 본다. 다행히도 시카고 세종문화회에서는 세계시조 경연대회를 매년 열고 있고, 지난해에는 약 18개국에서 온 1,500명 정도가 응시한다고 한다. 먼저 미국에서 우리의 시조가 미국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말의 아름다움을 만방에 펼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본다. 우리 말과 글도 잘 가꾸고 다듬어야 사랑받는 글이 될 것이다.
<끝>
- 이전글 훈민정음(SG영상디자인 그룹 명예회장)
- 다음글 훈민정음(사회복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