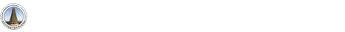언문 편지에 실어보낸 지아비 마음(전 서울한영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
장정복 | 조회 621
조선시대 언문 편지에 나타난 부부의 정
장정복(전 서울한영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
2016년 6월 29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서 개최되었던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 특별전을 관람했던 기억의 한 페이지를 끄집어 내본다. 그때 내 눈에 띤 학봉 김성일이 아내 안동 권씨에게 보낸 언문 편지는 사대부가 아내에게 사랑을 고백한 내용도 특이했지만 한문의 난해함을 염려해서인지 사대부가 드물게 언문으로 아내를 위해 보낸 서간이었기 때문이다.
학봉 김성일(1538-1593)은 경상우도감사로 부임하여 임지인 진주로 이동하는 중에 경남 산음현(현 산청)에 잠시 머무르는 동안 전쟁 와중에도 안동 본가에서 장모를 모시고 있는 아내 안동 권씨에게 한 장의 언문 편지를 보냈다. 편지 끝에 발신일을 '서달 스믈나한날'로 적었고 발신자 표시에는 '김'이라고 적었는데, 그 내용을 살짝 들여다보면, 평소의 서간문에서처럼 먼저 산음에 와서 잠시 머무르고 있는 자신의 안부를 간단히 전하면서 장모를 모시고 새해를 잘 맞이하라고 당부하는 글귀에서 새해를 앞두고 보낸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감사가 되었어도 음식을 아무것도 보내지 못해 미안해하는 안타까움과 함께 자신과 떨어져 있을 아내를 염려하는 애틋한 마음을 담아서 그리워하지 말고 편안히 있으라고 편지를 마무리하였다.
“요즘 같은 추위에 모두 어찌 계시는지 가장 생각하고 생각하오.
나는 산음고을로 와서 몸은 무사히 있지만 봄이 닥치면 도적들이 해롭게 할 것이니 어찌할 줄 모르겠오.
또 직산에 있던 옷은 다 왔으니 추워하고 있는지 걱정하지 말고, 장모 모시고 과세(過歲)를 잘하시기 바라오.
자식들에게 편지 쓸 상황이 안 되니, 잘있으라고 전해 주시오.
감사라고 하여도 음식을 가까스로 먹고 다니니 아무것도 보내지 못해 미안하오.
살아서 서로 다시 볼 수 있을지 기약하지 못하오.
나를 그리워 하지 말고 편안히 계시오. 그지없어 이만.
섣달 스무나흔날.
김”
김성일이 아내 안동권씨에게 편지를 쓴 시기와 장소는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으로 1차 진주성 전투가 끝난 후 산읍에 도착했을 때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당시 김성일의 아내는 홀몸으로 어머니를 모시며 생활하고 있는 처지이며 자신은 감사를 지냄에도 곡식을 보내지 못한다고 미안해 하고 있는 아내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숨기지 않는 유언장 같은 편지를 읽으면서 콧등이 찡해옴을 느꼈다.
‘가장 생각하오’라는 말에 아내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배어 있고, ‘그리워하지 말고 편안히 계시오’라는 말에는 근엄한 선비의 아내 사랑하는 은근한 마음씨가 촉촉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감사라고 하여도 음식을 가까스로 먹고 다니니 아무것도 보내지 못해 미안하오.’라는 글귀는 아마도 사재를 털어 백성 구휼에 힘쓰느라 집에 부칠만한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편지내용 중에 나타난 도적은 왜적을 가리키는 것이며, 1차 진주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만하지 않고 후일을 대비하던 김성일의 성격이 잘 드러나 있는 듯하다. 아내에게 이 편지를 쓸 당시 김성일은 구황과 내년 경작 대비, 전쟁 대비로 인해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잠도 이루지 못했고 머리가 하얗게 셌다'는 구절이다. 이 구절로 보아 아마 이 시기의 과로가 병의 원인이 된 듯 이 편지를 아내에게 보낸 다음 해인 1593년 4월에 병사했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와중에도 사랑하는 아내에게 언문 편지를 부친 것을 볼 때 아내를 그리워하면서도 가서 만나지 못하지만 마음만은 아내를 위한 배려와 지아비의 애틋한 애정을 짐작할 수 있었다.
나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김성일의 아내 안동 권씨(1538-1623)가 한없이 부러워지면서 지아비에게 이렇게 애틋한 편지를 받을 수 있었던 그녀가 궁금해져서 집에 오자마자 검색해 보았더니 고려 때 태사를 지낸 권행의 후손이며, 전력부위 권덕황의 딸로, 정부인에 추봉되었다는 것만 알 수 있었다.
이 편지는 현재 전하는 학봉 김성일의 편지 가운데 유일한 언문편지이기도 하지만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되었다. 더욱이 임진왜란 당시의 시대 상황과 아내에 대한 애틋함이 잘 드러나 있어서 역사학적으로나 국문학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 편지글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한다.
수백 년 전의 부부간의 편지가 여전히 현대인의 마음에 와 닿는 것은 그 사연의 진실성과 시공을 초월한 인간 삶의 보편성을 표현할 수 있는 위대한 문자 훈민정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