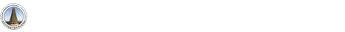훈민정음과 한글(용인시민방송기자)
이금로 | 조회 479
훈민정음과 한글
이금로(용인시민방송 기자, 전 국민은행 지점장)
우리나라의 가장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은 누가 뭐라 해도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고 할 수 있다.
훈민정음은 1443년 창제된 글자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과 글자의 내용을 적어 놓은 책의 이름으로 나뉜다. 훈민정음의 판본은 한문본과 언해본이 있다.
한문본에는 원본이라 부르는‘해례본’과 세종실록에 실린‘실록본’등이 있다. 언해본은 훈민정음 본문(예의)에 대한 번역이고, ‘세종어제훈민정음(서강대학본)’, ‘희방사본’, ‘박씨본’ 등이 있다.
1446년 음력 9월에 반포된 훈민정음 판본에는 1443년에 창제된 훈민정음을 공표하는 조선왕조 제4대 임금 세종(재위 1418-1450)의 반포문(頒布文)이 포함돼 있다.
훈민정음은 문자 체계의 혁명을 불러왔다. 한자로는 쓸 수 없던 한국인의 말까지 완벽히 표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자는 중국인을 위한 문자 체계이며, 음운 체계와 문법 구조가 한국어와는 완전히 달랐다.
세종 시대에 창제해 쓰던 글말은 28자의 훈민정음 문자 체계로 쓴 것이고, 오늘날 쓰고 있는 글말은 28자 중에서 넉 자를 제외한 24자의 한글 문자 체계로 쓰는 것이다.
훈민정음 문자 체계는 자연의 원리에 따라 사람의 말소리를 음소 단위로 분석하고 그에 걸맞은 모양의 기호를 배치했다.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들을 수 있는 말소리를 손으로 쓰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글 소리로 쓸 수 있게 한 것이다.
훈민정음은 28개의 음소를 활용해 말소리 생성원리와 일치하게 글자를 만드는 문자 체계다. 한글은 28자의 훈민정음에서 잘 쓰지 않는다는 4개의 음소를 없애고 24개의 음소만으로 사람의 말소리를 표현할 수 있게 만든 문자 체계다.
단순히 음소의 개수만 차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연서, 병서, 합용 등의 여러 운용체계도 뒤바꾸거나 없애버린 것이다. 즉 말소리 생성원리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여기저기 생겨나면서 말소리와 글 소리가 제대로 통하지 않게 됐다.
훈민정음 창제 후 제대로 된 문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제강점기 조선어학회에서 24자의 한글맞춤법으로 표준화해버린 것은 훈민정음 창제자의 의도와는 맞지 않는다.
이제라도 21세기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훌륭한 문화유산인 훈민정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은 그 원리와 통하는 글말을 쓰게 되면, 표현의 범위, 변별의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우리나라 고유의 글자를 ‘한글’이라고 한다. 그런데 한글은 훈민정음, 정음, 반절, 언문, 암클, 증글, 본문, 상말글, 아문, 국문, 조선문, 조선글, 한국글, 배달글, 우리글 등의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거나 불리기도 한다.
‘한글’이란 △큰 글자 △세상에서 좋은 글자로는 이 ‘한글’ 밖에 없다 △쉽고 조리 있기로 세계 으뜸 △한韓나라의 글자 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고유명사로 부르거나 보통명사로 불러도 적합한 이름으로 더할 나위 없다.
독창성과 대체 불가능의 문자인 훈민정음, 오늘날의 한글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한국인의 훌륭한 문화유산이다. 전 세계인의 언어를 표기하는 국제음성기호로 부족함 없고, 세계 인류가 좀 더 잘 소통하는데 ‘한글’만큼 좋은 문자가 없다고 생각한다.
소설가 이인화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2061년 미국 워싱턴과 1896년 조선 제물포를 오가며 펼쳐지는 타임슬립(timeslip) 소설인 장편 소설‘2061년’을 2021년 출간했다. 여기서 세종이 창제한 훈민정음이 인공지능의 소리와 생각을 표기하며 2061년 세계 공용문자가 된다고 설정했다.
소설 속 현실이 k-한류를 타고 성큼 다가오는 것 같다.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지혜를 모으고 연구 발전시켜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