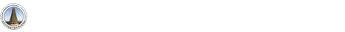그날이 내년이었으면 좋겠다(선정고등학교 국어교사)
최홍길 | 조회 564
그날이 내년이었으면 좋겠다
-문맹자에게 운전면허 취득의 기쁨을
서울선정고등학교 국어교사
최홍길
필자가 재직중인 고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은 ‘국어’를 1주일에 네 시간씩 배운다. 교과서의 10개 대단원 가운데 8단원에는 ‘국어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제목 아래 ‘국어의 변천과 발전’의 소단원이 있는데, 국어사의 시대구분을 비롯해서 훈민정음 창제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음운과 어휘 그리고 문법 등의 변천 과정을 간략하게 학습한다.
본문 학습이 끝나면 이어서 ‘학습활동’을 하게 되는데 ‘나랏말ᄊᆞ미’로 시작하는 훈민정음의 서문과 용비어천가의 2장과 125장이 지문으로 나온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외국어(?)처럼 보이는 음운과 발음에 힘겨워하다가도 교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언어의 역사성을 자연스럽게 인지한다.
서문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자주정신과 애민정신, 실용정신을 강조한다. 국어와 한자는 서로 통하지 않기에 힘없는 백성들을 생각해서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다는 세종대왕의 거룩한 마음을 알아야 한다고 여러 번 역설한다. 재위 기간 동안 측우기 등을 제작하고 국토를 확장하는 등 조선 왕조의 기틀을 단단히 다졌기에 ‘대왕’이라고 불린다고도 덧붙인다.
얼마 전에 필자는 여름방학을 맞아 고향인 자은도(慈恩島)를 찾았다. 맑은 하늘과 푸른 산 시원한 들판이 있는 그곳은 꾸미지 않은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아직도 농사를 짓고 있는 부모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충격적인 에피소드 하나를 접했다. 필자와 나이가 비슷한 옆 동네 남자가 아직도 한글을 못 읽는다는 거였다.
1970년대에 특히 육지와 떨어진 섬에서 초등학교를 다닌 적이 있는 사람들은 알 것이다. 60여 명이 있는 한 학급에 서너 명 아니 그 이상이 자기 이름을 제대로 못 썼다는 사실을. 그런데 21세기도 어느새 22년을 지났고,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초연결·초지능·초융합을 논하고 있는 이때에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건 경천동지할 일이다. 농한기 때 70대 이상의 노인들을 위한 문해교실(文解敎室)은 지금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나, 한창 일할 나이인 50대 중반인 젊은이가 아직도 제 이름을 못 쓰다니!
이 사람은 조실부모했기에 초등학교를 마치자마자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지금까지 이러구러 살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 물려받은 게 없어서 개인사업은 할 수도 없고, 배운 것 또한 없어서 더더욱 앞길이 막혀버린 것이다. 따라서 언제나 책임자 역할은 남에게 넘겨주고, 조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주변 사람들과는 스스럼없이 말은 잘하지만, 글은 못 읽는다. 그리고 못 쓴다. 핸드폰은 갖고 있으나, 문자는 못 보낸다.
돈을 더 많이 벌려면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하기에 면허증을 따려고 몇 번 시도했다고 한다. 일종의 문맹자이기에 시험관이 시험문제를 두 번 불러주고 이걸 들은 후 OMR 카드에 정답을 체크해서 70점을 넘으면 면허증을 딸 수는 있다. 그러나 거듭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필자는 어휘력 부족으로 결론을 내렸다.
2년 전에 동료교사들과 방학을 이용해 베트남의 사파를 다녀온 적이 있었다. 거기서 소수민족 출신인 현지 가이드와 인근의 여러 곳을 동행했는데 그 여자 또한 문맹이었다. 베트남 말은 자연스럽게 해도, 밥벌이 때문에 주워들은 영어를 구사해도 결과적으로 읽고 쓸 줄을 몰랐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정인지 서’에는 명석한 사람은 하루 아침에, 둔한 사람이라도 열흘 이내에 이 문자를 배울 수 있다는 대목이 있다. 이 구절을 떠올리면서 방학이 돌아오면 고향의 이 남자에게 한글을 가르쳐서 면허증을 따게끔 해보겠다고 제안하자 부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필자는 고등학교 국어교사 아닌가! 하루에 한두 시간씩 열흘 정도를 가르치면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지 않겠는가! 성조(聲調)가 있는 중국어·베트남어 같은 외국어는 일단 배우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 한글은 성조가 일찍 사라졌기에 진짜 배우기 쉽다. 이 남자가 한글 공부를 제대로 한 다음 운전면허증을 따서 반갑게 포옹하는 그날이 어서 속히 왔으면 좋겠다. 그게 내년이었으면 참으로 좋겠다.